경기문화재단
용인 할미산성 龍仁 할미山城
경기도기념물 제2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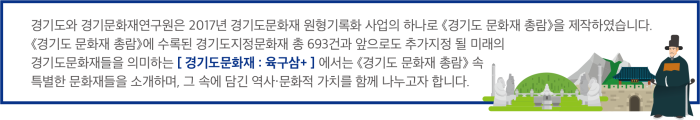
<용인 할미산성>은 할미산(해발 349m)의 정상과 그 남쪽의 능선 일부를 둘러싼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할미산 동쪽에는 금학천, 운학천, 양지천 등이 합류하여 경안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된다. 서쪽으로는 석성산에서 발원한 신갈천이 오산천과 진위천을 거쳐 서해의 남양만에 이르고, 탄천이 북류하여 한강에 유입된다. 이렇듯 할미산성은 탄천, 경안천, 진위천으로 이어지는 수운 교통요지에 위치하며, 하천과 주변 평야지대가 모두 조망되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육로로는 서울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남북·동서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다. 할미산성은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비롯한 조선시대 지지류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2)에 관련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언제, 누가 축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할미산성 전경, 2014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 백제 한성기의 대형 집수시설 2기, 다수의 저장시설 등과 함께 다수의 한성백제토기가 출토되어 신라에 의해 석축산성이 축성되기 이전에 백제의 관방유적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백제에 의해 축성된 성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할미산성, 201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산성은 성내부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내성벽에 의해 북쪽의 내성, 남쪽의 외성으로 구분된다. 평면 형태는 성벽이 지형을 따라 진행하고 있어 불규칙한 타원형이다. 성벽은 일정한 규격으로 성돌을 가공하여 협축으로 정연하게 쌓았다. 성벽은 장방형 석재로 쌓거나, 장방형석재로 층을 맞추고 그 위에 판상석을 올리고 다시 장방형 석재를 쌓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내벽과 외벽의 너비는 5m 정도이나 일부 4m 정도로 좁은 구간도 있다. 내·외벽의 기저부에는 보축하여 성벽을 보강하였다. 외벽의 보축은 기저부에 1~2단 가량의 석재를 넓게 붙인 형태이고, 내벽의 보축은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체성벽에 덧붙인 형태이다. 성내 시설물로는 성의 중앙에 위치한 추정 저수시설이 확인되었다. 성벽에는 수구도 설치되었다.


할미산성 1호 초석 건물지, 할미산성 성벽, 201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할미산성 출토 부가구연대부장경호, 2004 ©경기도박물관 할미산성 출토 철촉, 201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성 내부의 정상부 평탄지에서는 25기의 수혈주거지와 성벽에 인접하여 부가구연장경호附加口緣長頸壺와 고배高杯 등이 매납된 제의유구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출토유물은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신라후기 양식의 토기로서 석축성벽의 축성기법과 함께 신라에 의해 축성되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관방유적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성내부에서는 6세기 중엽~7세기 전반의 신라유물이 주로 출토되지만, 이후의 조사에서 장방형 초석건물지 2동, 팔각건물지 2동 등과 함께 통일신라시대 토기, 철기들도 다량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에도 관방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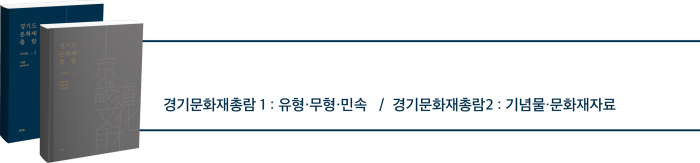
경기문화재총람 속 더 많은 문화재들을 만나고 싶다면
경기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http://gjicp.ggcf.kr 에 방문해 보세요!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글쓴이
- 경기문화재단
- 자기소개
-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경기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