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정조어제 채제공선생 뇌문비 正祖 御製 蔡濟恭先生 誄文碑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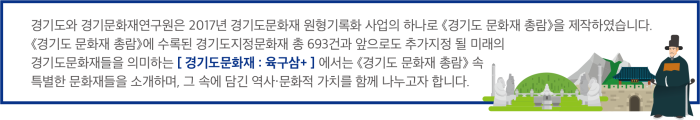
<정조어제 채제공선생 뇌문비>는 1799년(정조23) 1월 18일에 채제공蔡濟恭(1720~1799)이 사망하자 정조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어 보낸 뇌문을 새긴 비석이다. 뇌문誄文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공적을 기리는 글이다. 제문祭文이 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면, 뇌문은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적을 서술함으로써 추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다.
정조의 이 글은 4언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500자가 넘는 장문이다.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문숙공채제공장일치제문文肅公蔡濟恭葬日致祭文’이란 이름으로, 채제공의 문집 『번암집樊巖集』에는 ‛사제뇌문賜祭誄文’이란 이름으로 각각 실려 있다. 특히 ‛사제뇌문’이란 제목 아래쪽에 작은 글자로 ‘명수비묘도命竪碑墓道(무덤길에 비를 세우도록 명했다)’란 문구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정조의 명으로 비석이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제공의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1743년(영조19) 문과에 급제하였다. 1748년에 영조의 탕평을 표방한 특명으로 선발되어 청요직淸要職인 예문관사관직을 거쳤으며, 1753년에는 충청도 암행어사로 균역법均役法 실시 과정상의 폐단과 백성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올렸다. 그는 1758년(영조34) 사도세자와 영조의 사이가 악화되어 세자 폐위가 논의되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이를 철회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후일 영조는 채제공을 가리켜 “진실로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고 충신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는 탕평정치를 표방한 영·정조를 적극 보좌해 당쟁을 억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1777년(정조1)에 왕을 살해하려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왕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수궁대장守宮大將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음모를 적발하였고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왕을 충실하게 보필하였다. 특히 10여 년을 재상으로 있는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왕을 보필하면서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다. 말년에 수원성역을 담당하다가 사직하였다.


정조 어제 채제공선생 뇌문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저서로 『번암집』이 있는데, 정조는 채제공의 문집 간행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어정범례御定凡例’를 친필로 써서 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조 사후 1801년에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으로 추탈관작 되었다가 1823년 영남만인소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비석은 묘소의 오른쪽에 건립된 비각 안에 있으며,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팔작지붕돌을 얹었다. 앞면 상단에는 ‘어제뇌문御製誄文’이란 두전頭篆이 있는데 미수전眉叟篆으로 불리는 허목의 서체다. 미수전은 허목의 학통을 이은 영남 남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채제공 또한 허목의 학통을 이었기 때문에 미수전을 두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전이 ‘어제어필뇌문’이 아닌 ‘어제뇌문’인 걸로 보아 뇌문이 정조의 친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채제공의 장례일인 1799년 3월 20일에 제문을 내리고 각신閣臣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러자 검교대교檢校待敎 이존수李存秀(1772~1829)가 3월 25일에 장지인 용인으로 출발했고, 제사를 마친 후 3월 27일에 돌아왔다. 따라서 비문 끝에 ‘기미삼월이십육일己未三月二十六日’이라 한 것은 제사를 지낸 날짜인 것으로 보인다. 비석이 제사를 지낸 날에 세워진 것인지,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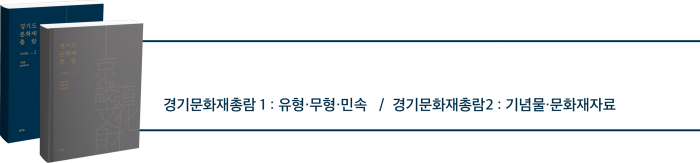
경기문화재총람 속 더 많은 문화재들을 만나고 싶다면
경기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http://gjicp.ggcf.kr 에 방문해 보세요!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글쓴이
- 경기문화재단
- 자기소개
-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경기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