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9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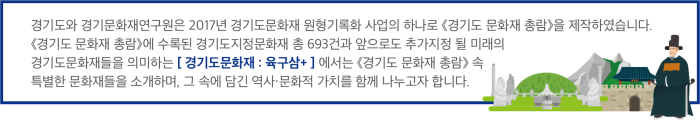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상운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본존상인 아미타여래와 좌협시인 관음보살상은 조각기법이 동일한 반면 우협시인 대세지보살상은 크기와 조각기법이 달라 다른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불신에 비해 머리가 크며, 방형의 상반신에 적당한 다리 폭으로 신체비례가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결가부좌한 자세에 손모양은 양다리 위에 살짝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인을 하고 있다.
머리는 육계와 경계가 없이 가운데에 중간계주, 정수리에는 정상계주를 각각 두었다. 둥근 얼굴에 수평으로 가늘게 그은 눈, 콧등이 둥근 큼직한 코, 가늘고 긴 입술에 희미한 미소로 단정하면서도 인자한 인상을 느끼게 한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에 복견의覆肩衣를 걸치고 그 위에 다시 대의를 돌려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물방울 모양의 대의주름 하나가 크게 강조되어 있으며, 가슴 아래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운데를 수평으로 접어 아래쪽을 굵고 도드라지게 조각하여 모양을 내었다. 배 앞의 복견의와 대의는 대칭으로 서로 교차되어 있다. 다리사이 부채모양의 옷 주름 표현, 왼쪽 다리 위에 무릎을 감싼 넓적한 옷자락 표현은 이 불상에서 주목되는 특징이다.

좌협시의 관음보살상은 본존상에 비해 작은 규모로 협시상을 작게 하여 격을 달리 표현하는 조선후기 특징을 따르고 있다. 머리에는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고, 오른손은 다리 위에 두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연가지를 받쳐 들고 있다.

우협시인 대세지보살상은 두 상에 비해 16cm 이상 작고, 얼굴·법의 등 표현기법에 차이가 있다.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숙인 상반신에 양손으로 연가지를 받쳐 든 모습으로 좌협시와 대칭을 이룬다. 옆으로 벌어진 낮은 보관을 쓰고 보관 위로 쌍계형의 보계가 드러나는 것은 관음보살상의 높고 화려한 보관과는 차이가 있다. 턱이 갸름한 얼굴에 사선으로 올라간 눈, 작고 뭉툭한 코, 입 끝이 살짝 올라간 작은 입술을 특징으로 하며 아이 같은 귀여운 인상이다. 끝이 뾰족해진 배 앞 복견의의 옷자락과 다리 사이로 길게 좌대 바닥까지 내려온 옷주름은 두 상과는 또 다른 특징이다.

삼존상에 대한 기록은 본존과 좌협시인 관음보살상에서 확인되었는데 관음보살상 대좌 윗면의 묵서 조성기에는 강희 52년(1713) 노적사露積寺 별실에서 조성해 극락보전에 좌보처 관음을 봉안했으며, 진열進悅·영희靈熙·태원太元·처림處林·청휘淸徽가 조성했다는 내용이 있다. 본존인 아미타상의 대좌 명문은 개금중수에 관한 것으로 옹정 8년(1730)에 아미타삼존상을 백기白基·현특玄特이 개금해 상운사祥雲寺에 봉안했다는 것이다. 조성기에 보이는 노적사는 상운사와 같은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운사는 1745년 『북한지北漢誌』에 북한산성 축조 후 건립된 11개의 사찰중 하나로 1722년에 창건되었다고 하고, 1813년 ‘상운사극락전중창기祥雲寺極樂殿重創記’와 1943년 안진호의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도 노적사로 출발하여 1722년 회수懷秀가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에도 노적사露積寺는 곧 삼각산 상운사祥雲寺로 기록되어 있어 노적사는 1722년에 상운사로 다시 개창되었으며, 삼존상도 함께 조성하여 봉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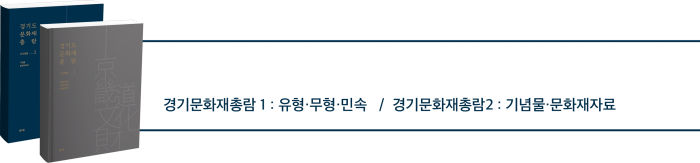
경기문화재총람 속 더 많은 문화재들을 만나고 싶다면
경기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http://gjicp.ggcf.kr 에 방문해 보세요!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글쓴이
- 경기문화재단
- 자기소개
-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경기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