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스페셜호 | 참으로 답답한 자리
온라인 고민공유 집담회 - 고민빨래방
늘 그렇지만 고민 빨래방 같은 자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만나는 자리다.
무언가 자신의 패를 끝까지 꺼내 놓지 않고 남의 패만 기웃거리는 자리,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이미 속아 봐서 절대로 타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자리,
불편한 압박에 의해 무거운 마음으로 겨우 참가해 빨리 자리가 파하기만을 기다리는 하염없는 자리가 되기 일쑤이다.
그것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 ’라던가 혹은 ‘통화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떠나 우리에게 이미 팽배한 불신의 경험을 어떻게 불식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참으로 답답한 자리에서 우리는 만났다.
윤리적 스텐스(stance)
누구는 철학을 질문하고 누구는 작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답한다. 지원과 정책을 대변하는 대변인(컨설턴트)들의 말발은 견고하고 또 유연하다. 저런 번지르르함은 처음 본다는 웅성거림이 들린다. 말의 초점이 틀리니 대화와 소통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 수차례 서로의 간을 보고서야 겨우 핑퐁 같은 말의 랠리(rally)가 오고 간다. 말은 섞어봐야 상대의 심중을 알 수 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와 ‘상 도덕의 문제’이다. 어차피 문화예술교육판이 아사리판이 되지 않으려면 이 문제는 풀고 가야 할 숙제이다. 시전의 법도처럼 우리에게도 넘어서면 안 되는 윤리가 필요하니 그 윤리적 스텐스(stance)가 우리에겐 중요하다.
레트로 한 빨래방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우리가 서로 말을 섞을 만한 상대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의 인정은 신의를 만들 수 있는 인정이고 그 인정을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부르며 상호 신뢰감을 가지고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동료 의식과 연대감으로 확장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우리의 빨래방이 서로의 세탁기 앞에서 코인을 넣고 빨래가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핸드폰만을 바라보고 있는 빨래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레트로 한 감성으로 돌아가 고전적인 빨래터에서 수다를 함께 떨며 함께 방망이질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공공의 적
광야는 넓고 빨래터는 많다.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 의제가 되고 제도적으로 지원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수 없이 많은 빨래터 같은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빨래터가 사라지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신뢰의 경험과 지혜가 사라진다. 혹 자는 그깟 빨래터 다시 만들면 그 뿐이라고 말하지만, 고민과 질문의 얼룩과 흔적이 난무한 빨래와 사람들, 그 빨래터를 소모적으로 다루고 판단하는 그 자를 난 공공의 적이라고 부른다.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빨래터에서 삐쭉거리며 서로의 간을 봐야 하는 이 불편의 자리는 늘 그런 공공의 적 때문이다.
속내를 나눌 친구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겨우 우물 하나 다시 파고, 물길을 하나 내고 빨래를 시작한 것 밖에는. 나는 이 빨래터에서 아직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다. 이제 성질을 좀 죽여 가며 말을 섞어봐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빨래터를 제발 오랫동안 오고 가며 친구도 사귀고 동료도 사귀고 싶다. 나는 공동체도 싫고 연대도 불편하지만 가끔은 속내를 나눌 친구는 필요하다.
그 속내(하고 싶었던 말)
왜 나의 교육이 예술이 되지 못할까? 술 마시고 취해서 농담처럼 던지는 호기 어린 질문이 아니라 늘 내 주변을 맴도는 매우 시니컬하게 던져진 나의 숙제 같은 질문이다.
이미 나는 그 답을 어느 정도 풀어 가고 있지만, 타자에게도 이 질문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그것은 예술과 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 문화예술교육은 캠페인이나 프로파간다가 아니다.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타자에게 배우고 전이되고 전환되는데 불편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강요와 부담의 자리에 자율과 용기를 내어주고 서로의 삶에 간섭과 박수를 보내고 시비를 걸고 흠모의 짝사랑을 앓아가면서, 차이와 다름에 주목하고 가치와 의미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방식을 따른다. 적어도 공평한 관계적 긴장과 밀도는 삶과 예술, 교육에서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으로부터 다시 타자의 삶에 문화예술교육에 다시 질문을 던지며 빨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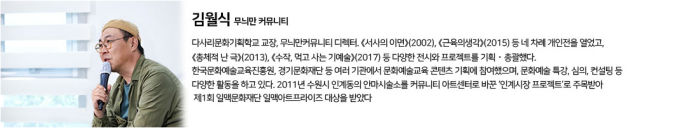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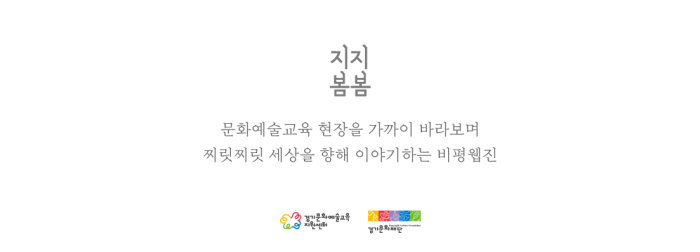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부정보
웹진 '지지봄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2012년부터 발 행하고 있습니다. ‘지지봄봄’은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까이 바라보며 찌릿찌릿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이라면 어디든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다양한 삶과 배움의 이야기와 그 안에 감춰진 의미를 문화, 예술, 교육, 생태, 사회, 마을을 횡단하면서 드러내고 축복하고 지지하며 공유하는 문화예술교육 비평 웹진입니다.
@참여자
- 글쓴이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자기소개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으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하며 성장하는 ‘사람과 지역, 예술과 생활을 잇는’ 플랫폼으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